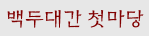백두대간 사람들 9 설악산 장수대- 키 큰 소나무 그늘에 묻힌 산골 재롱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강 댓글 0건 조회 235,206회 작성일 18-08-28 12:24본문
강원도 인제군과 양양을 잇는 국도 44호선. 긴 곡선을 그으며 한계령을 오르는 잿빛 포장도로 아래 또 하나의 길이 있다. 한계령 옛길이다. 산에서 태어나 산에서 평생을 보낸 홍기복(68) 할아버지에게 그 길은 잊혀진 고향이다. “전쟁이 끝나고 군인들이 기와집을 짓고 장수대라고 부르면서 마을 이름도 장수대로 바뀌었지. 예전에는 자양전(紫楊田)이라 적고 재롱밭이라고 불렀지. 햇볕이 좋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야. 위 재롱밭 아래 재롱밭으로 나눠 불렀을 정도로 동네가 꽤 컸어.”
험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한계령 오르는 길. 그 어디에 100호가 살 만한 터전이 있었을까 하는 의심은 홍 할아버지의 회상으로 씻겨진다. 일제시대 장수대 지역은 중석이 많이 나던 광산지대였다고 한다. “대성광산, 설악광산, 하신광산이 컸어요. 형석을 캐던 광산도 하나 있었는데, 폭탄 만드는 데 쓴다고 했지. 돌을 냅다 던지면 불길이 확 일곤 하던 돌이었는데….” 당시 광산 일이란 것이 순전히 사람의 힘만으로 이뤄지는 것이라 재롱밭에는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채굴에서 분류, 운송까지 온전히 사람의 몫이었다. “이곳 건천골에는 하신광산 굴이 있었어요. 캐낸 돌을 지게로 져 내리면 쇠공이를 단 디딜방아로 돌을 부숴, 그렇게 해서 골라낸 광석을 다시 가마니에 담아 지게로 양양으로 날랐지.” 그 돌을 양양까지 실려 보낸 다음에야 철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지만 믿을 것은 하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당시 광산에는 저마다 제당을 두고 하늘에 혹은 산신령에게 치성을 드리는 것이 안전장치의 전부였다.
“예가 논이 있던 자리인데 벌써 나무가 이렇게 자랐네.” 파란 이끼가 잔뜩 낀 축대가 층층이 쌓인 곳에는 나무가 무성했다. 돌로 축대를 쌓고 높은 곳의 흙은 깎아 내리고 낮은 곳은 북돋워 계곡의 물을 대고 벼를 심었지만 척박한 산골 다락논은 소출이 변변치 않았다. 한마지기 100평에 쌀 닷말이 나면 풍년 들었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했다. “비료가 있나 농약이 있나. 봄에 아궁이를 뜯어내 재를 긁어다 뿌리고, 누에 똥을 받아다 뿌리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도 벼농사를 마다하지 않은 것은 조상님 제상에 쌀밥 한 그릇 올리겠다는 각오 때문이었다.
궁벽진 산골살림을 지탱하던 형제간의 우애 못지 않게 넉넉했던 동네 인심은 해방과 함께 끝이었다. “여름이면 공출 조사를 나오는데 조이삭까지 셀 정도로 소출 계산이 정확했어요. 가을에 수확하고 나면 먹을 것도 안 남겨두고 싹쓸어갔다니까.” 기다리던 해방. 재롱밭 사람들에게는 여우굴을 피하려다 호랑이굴에 뛰어든 셈이었다. 광산은 모두 철수됐고 그 자리는 남북을 오가는 빨치산들이 차지해 버렸다. “이름이 유명학이라는 사람이 대장인 빨치산이 동네사람을 많이 죽였지.” 가리산만 넘으면 38선 이남이었기에 남쪽 유격대들도 곧잘 38선을 넘어 인민군을 습격하고 돌아가곤 했다 한다. “호림부대라고 있었어요. 설악산 대청봉까지 넘은 부대였는데 여기 재롱밭에 들어와 북한군에 포위됐어요. 정말 난리가 났었지.”
한국전쟁의 포성이 심해지기 전부터 동족 상잔의 비극을 지켜본 홍 할아버지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진다. “애고, 난 여기만 지나면 등골이 오싹해.” 한국전쟁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한계령은 중공군과 인민군의 주요 퇴각로였다. “낮에는 숲에 숨어 있다 밤이면 북으로 달아났는데 그 날은 날이 밝을 무렵까지 행군들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비행기가 날아오고 폭탄이 터지고 참 많이 죽었어. 어림잡아도 1개 대대는 넘을 거야. 꼬박 이틀을 시체를 치웠으니까.” 그때 수많은 시체를 매장할 길이 없어 시체를 폐광에 묻었다는 거였다.
전쟁이 끝나고 재롱밭에 활기가 돌아온 것은 60년대 들어서였다 한다. 원래 토박이들은 전쟁통에 죽거나 북한의 소개정책으로 많은 이들이 북으로 떠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전쟁의 와중에 삶의 터전을 잃고 재출발을 하기 위해 찾아든 외지 사람들이었다.
박병의(67) 할아버지가 재롱밭에 들어온 것도 1962년이다. “저 삼거리에 다리가 없어 나룻배를 타고 한계천을 건너다니던 시절이었어요. 한 5년만 고생하고 다시 나가겠다는 것이 동네가 없어지고도 20년이 넘도록 이곳을 못 떠나고 있지.” 당시엔 원통 쌀가게에 가서 재롱밭에서 왔는데 석이버섯을 따러 갈 거라고 말만 해도 쌀을 외상으로 퍼주었다고 한다. 석이버섯 1근을 쌀 닷되와 맞바꾸던 시절이었다.
계곡마다 군 보안대가 있었지만 산불만 나지 않으면 화전을 말리지 않았다. 화전에 당귀, 천궁 같은 약초를 심고, 산일을 하면 식구들 입에 거미줄은 치지 않았다. 게다가 설악산 경치에 대한 입소문이 나면서 늘기 시작한 관광객들도 마을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한계령 길이 넓어지기 전까지 장수대는 설악산 관광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장수대 산장도 있어 화가들이며 작가들도 장수대를 찾았다. “밥만 팔아도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었어요. 관광객들을 상대로 뱀이나 산짐승, 약초 따위를 팔기도 했고요.” 장수대가 관광지로 명성을 높이는 데는 최범선씨 집에서 키우던 곰도 한몫했다 한다. “영리했어요. 사람도 잘 따르고. 심지어는 부엌에 있는 밥까지 꺼내 먹었으니까.” 그 곰을 보려고 일부러 장수대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다.
장수대의 그런 활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길이 넓어지고 설악동이 개발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은 줄어들었다. 75년과 78년, 두차례에 걸친 이주정책이 결정적이었다. 화전민 정리와 국립공원지역 보호가 명분이었다. 사람들이 떠난지 불과 20년. 수 백년을 이어왔다는 재롱밭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몇몇 노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나 들을 수 있는 전설이 돼버렸다.
산골사람들이 궁벽진 삶을 꾸리던 재롱밭은 지금 소나무 천지가 돼버렸다. 키가 수십미터에 이르는 잘 자란 소나무 숲에 옛 사람들의 삶의 자취는 점차 묻혀간다.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것이 자연뿐만은 아닐 것이다
출처: http://100mt.tistory.com/entry/백두대간-사람들-9-설악산-장수대-키-큰-소나무-그늘에-묻힌-산골-재롱밭 [<한겨레21> 신 백두대간 기행 블로그]
험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한계령 오르는 길. 그 어디에 100호가 살 만한 터전이 있었을까 하는 의심은 홍 할아버지의 회상으로 씻겨진다. 일제시대 장수대 지역은 중석이 많이 나던 광산지대였다고 한다. “대성광산, 설악광산, 하신광산이 컸어요. 형석을 캐던 광산도 하나 있었는데, 폭탄 만드는 데 쓴다고 했지. 돌을 냅다 던지면 불길이 확 일곤 하던 돌이었는데….” 당시 광산 일이란 것이 순전히 사람의 힘만으로 이뤄지는 것이라 재롱밭에는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채굴에서 분류, 운송까지 온전히 사람의 몫이었다. “이곳 건천골에는 하신광산 굴이 있었어요. 캐낸 돌을 지게로 져 내리면 쇠공이를 단 디딜방아로 돌을 부숴, 그렇게 해서 골라낸 광석을 다시 가마니에 담아 지게로 양양으로 날랐지.” 그 돌을 양양까지 실려 보낸 다음에야 철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지만 믿을 것은 하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당시 광산에는 저마다 제당을 두고 하늘에 혹은 산신령에게 치성을 드리는 것이 안전장치의 전부였다.
“예가 논이 있던 자리인데 벌써 나무가 이렇게 자랐네.” 파란 이끼가 잔뜩 낀 축대가 층층이 쌓인 곳에는 나무가 무성했다. 돌로 축대를 쌓고 높은 곳의 흙은 깎아 내리고 낮은 곳은 북돋워 계곡의 물을 대고 벼를 심었지만 척박한 산골 다락논은 소출이 변변치 않았다. 한마지기 100평에 쌀 닷말이 나면 풍년 들었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했다. “비료가 있나 농약이 있나. 봄에 아궁이를 뜯어내 재를 긁어다 뿌리고, 누에 똥을 받아다 뿌리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도 벼농사를 마다하지 않은 것은 조상님 제상에 쌀밥 한 그릇 올리겠다는 각오 때문이었다.
궁벽진 산골살림을 지탱하던 형제간의 우애 못지 않게 넉넉했던 동네 인심은 해방과 함께 끝이었다. “여름이면 공출 조사를 나오는데 조이삭까지 셀 정도로 소출 계산이 정확했어요. 가을에 수확하고 나면 먹을 것도 안 남겨두고 싹쓸어갔다니까.” 기다리던 해방. 재롱밭 사람들에게는 여우굴을 피하려다 호랑이굴에 뛰어든 셈이었다. 광산은 모두 철수됐고 그 자리는 남북을 오가는 빨치산들이 차지해 버렸다. “이름이 유명학이라는 사람이 대장인 빨치산이 동네사람을 많이 죽였지.” 가리산만 넘으면 38선 이남이었기에 남쪽 유격대들도 곧잘 38선을 넘어 인민군을 습격하고 돌아가곤 했다 한다. “호림부대라고 있었어요. 설악산 대청봉까지 넘은 부대였는데 여기 재롱밭에 들어와 북한군에 포위됐어요. 정말 난리가 났었지.”
한국전쟁의 포성이 심해지기 전부터 동족 상잔의 비극을 지켜본 홍 할아버지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진다. “애고, 난 여기만 지나면 등골이 오싹해.” 한국전쟁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한계령은 중공군과 인민군의 주요 퇴각로였다. “낮에는 숲에 숨어 있다 밤이면 북으로 달아났는데 그 날은 날이 밝을 무렵까지 행군들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비행기가 날아오고 폭탄이 터지고 참 많이 죽었어. 어림잡아도 1개 대대는 넘을 거야. 꼬박 이틀을 시체를 치웠으니까.” 그때 수많은 시체를 매장할 길이 없어 시체를 폐광에 묻었다는 거였다.
전쟁이 끝나고 재롱밭에 활기가 돌아온 것은 60년대 들어서였다 한다. 원래 토박이들은 전쟁통에 죽거나 북한의 소개정책으로 많은 이들이 북으로 떠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전쟁의 와중에 삶의 터전을 잃고 재출발을 하기 위해 찾아든 외지 사람들이었다.
박병의(67) 할아버지가 재롱밭에 들어온 것도 1962년이다. “저 삼거리에 다리가 없어 나룻배를 타고 한계천을 건너다니던 시절이었어요. 한 5년만 고생하고 다시 나가겠다는 것이 동네가 없어지고도 20년이 넘도록 이곳을 못 떠나고 있지.” 당시엔 원통 쌀가게에 가서 재롱밭에서 왔는데 석이버섯을 따러 갈 거라고 말만 해도 쌀을 외상으로 퍼주었다고 한다. 석이버섯 1근을 쌀 닷되와 맞바꾸던 시절이었다.
계곡마다 군 보안대가 있었지만 산불만 나지 않으면 화전을 말리지 않았다. 화전에 당귀, 천궁 같은 약초를 심고, 산일을 하면 식구들 입에 거미줄은 치지 않았다. 게다가 설악산 경치에 대한 입소문이 나면서 늘기 시작한 관광객들도 마을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한계령 길이 넓어지기 전까지 장수대는 설악산 관광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장수대 산장도 있어 화가들이며 작가들도 장수대를 찾았다. “밥만 팔아도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었어요. 관광객들을 상대로 뱀이나 산짐승, 약초 따위를 팔기도 했고요.” 장수대가 관광지로 명성을 높이는 데는 최범선씨 집에서 키우던 곰도 한몫했다 한다. “영리했어요. 사람도 잘 따르고. 심지어는 부엌에 있는 밥까지 꺼내 먹었으니까.” 그 곰을 보려고 일부러 장수대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다.
장수대의 그런 활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길이 넓어지고 설악동이 개발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은 줄어들었다. 75년과 78년, 두차례에 걸친 이주정책이 결정적이었다. 화전민 정리와 국립공원지역 보호가 명분이었다. 사람들이 떠난지 불과 20년. 수 백년을 이어왔다는 재롱밭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몇몇 노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나 들을 수 있는 전설이 돼버렸다.
산골사람들이 궁벽진 삶을 꾸리던 재롱밭은 지금 소나무 천지가 돼버렸다. 키가 수십미터에 이르는 잘 자란 소나무 숲에 옛 사람들의 삶의 자취는 점차 묻혀간다.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것이 자연뿐만은 아닐 것이다
출처: http://100mt.tistory.com/entry/백두대간-사람들-9-설악산-장수대-키-큰-소나무-그늘에-묻힌-산골-재롱밭 [<한겨레21> 신 백두대간 기행 블로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