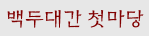백두대간 사람들 8 설악산- 산양이 뛰노는 모습을 보고 싶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강 댓글 0건 조회 226,123회 작성일 18-08-28 12:25본문
‘굽이져 흰띠 두른 능선길 따라/ 달빛에 젖어드는 계곡의 여운/ 내 어찌 잊으리요 꿈같은 산행을/ 잘 있거라 설악아/ 내 다시 오리니.’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10여년 전만 해도 별이 총총하던 설악산의 밤에 운치를 더하던 <설악가>는 이제 잊혀져 가는 것만 같다.
금강산 못지 않은 수려한 암봉과 아름다운 폭포, 그리고 하늘빛을 담아내던 담과 소들도 더이상 전설을 말하지 않는다. 무너미고개가 깔딱고개로 이름이 바뀌고 산장의 밤을 밝히던 무용담이 소음이 돼버린 지금, 용의 이빨을 닮았다는 용아장성의 용들은 죽었고, 천화대의 돌꽃들은 다만 정복의 대상일 뿐이다.
20세기의 마지막 해를 보내는 설악산은 “너무나 아름다운 슬픈 산”이라는 박그림(52·설악녹색연합 대표)씨의 표현이 차라리 어울려 보인다. ‘설악산 털보’라는 별호로 더 알려진 유창서(62·권금성산장 관리인)씨는 “낭만을 잊은 탓”이라고 말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신흥사안내인협회 회장 이대성 노인을 그리는 이병태(57·이병태치과 원장)씨는 배웠다는 사람들의 오만 탓으로 돌린다. “61년 설악산을 처음 찾은 나도 그랬지만 초창기에 설악산을 찾았던 학자니 문인이니 산악인치고 이 노인 신세를 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안내 없이는 산을 오르지 못할 정도였지요. 하지만 어디 보세요. 설악산에 관련된 수많은 책 가운데 이대성이라는 이름 석자 기록해놓은 것이 있나.”
그랬다. 설악산을 몸과 마음을 닦는 수도의 도량으로 여겼던 옛 사람들의 지혜만 잊지 않았어도 설악산은 옛 모습을 잃어가지 않을 것이다. 해마다 설악산을 찾아드는 300여만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신흥사 길목 나무다리에 적힌 ‘세심교’라는 세글자를 읽으며 대자연에 들기 위해 마음을 닦는 이들이 몇이나 될까? 유교를 받들던 조선조에도 하찮은 돌과 흙뿐인 대청봉을 왜 ‘청정등신 비로자나불’이라 했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권금성 가는 길목 작은 암자인 안락암 대웅전 안내판에는 새소리와 아침 계곡에서 피워올리는 물안개조차도 비로자나불을 향한 공양이라 적어놓고 있다. 나뭇가지 하나 작은 돌 하나도 귀하게 여기라는 뜻일 게다.
금강산의 그늘에 가리고 험악한 지형으로 발길을 막아내던 설악산에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기 시작한 것은 50년대 후반부터. 그로부터 40여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 곰들이 꿀을 찾고 산양이 뛰놀던 설악산은 ‘죽은 산’이 돼버렸다. “지난 95년 정부는 설악산을 세계자연유산에 등록하려고 신청을 했죠. 지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되면 개발할 수가 없다며 연일 반대시위를 하고…. 결국 없던 일이 됐죠. 96년 조사관이 설악산을 돌아보고는 ‘동물이 없는 설악산은 죽은 산’이라고 말했죠. 결국 세계자연유산 등록이 거부당하면 다시 신청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정부가 등록 신청을 철회해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나버렸는데, 아직도 정부는 제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박그림씨는 당시 조사관이 관리체계가 비효율적이고 장기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는 것 등을 지적했는데도 정부의 자세는 변한 것 같지 않다는 질타를 빼놓지 않는다.
국립공원 설악산관리사무소는 구조조정의 칼날에 잔뜩 주눅 들어 있다. 최고 83명이었던 정규 직원수는 51명으로 줄었다. 그나마 올 봄 또 한번 구조조정 바람이 몰아 닥치면 몇 명이 남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개발예산보다 복구예산이 더 커진 게 96년. 쓰레기 줍기에 그치던 환경보호 업무도 한단계 더 진전돼 생태계 복구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졌지만 4개 분소와 11개 매표소를 관리하는 데만도 힘이 부쳐 보였다. “산이 좋아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직장으로 택했는데 담당 구역을 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하는 일이 매일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손익을 따지는 경영 개념이 앞서는 국립공원 정책에 대한 불만들도 작은 소리로 새어 나온다. “경영만 따진다면 더 많은 편의시설을 갖추고 더 많은 입장객들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는 곧 더 많은 훼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립공원 정책은 다음 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30여년간 설악산을 사진에 담아온 성동규(52)씨는 최근 들어 잦아진 가뭄을 사람들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사람들이 오염을 시킨 탓이에요. 벌써 큰 눈을 보기 힘들게 된 것이 10년은 넘어요. 여름에도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렇지 않고.” 도감에도 나오지 않는 풀을 찾아내 여기저기 관련 기관에 알리지만 좀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도 성씨의 큰 불만 가운데 하나다. “설악산에는 아직 보고 되지 않은 미기록종들이 많아요. 설악산이 더 나빠지기 전에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설악산은 해마다 건조기인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는 문을 닫아건다. 산불이 두렵기 때문이다. 유난히 가문 올 겨울, 설악산은 그 기간을 보름이나 앞당겼다. 아직도 설악산에 기다리던 눈이 왔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성씨의 말대로 그것은 자연을 경외할 줄 모르는 인간에 대한 하늘의 경고일지 모른다.
* 설악가는 치과의사 이정훈씨가 1969년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출처: http://100mt.tistory.com/entry/백두대간-사람들-8-설악산-산양이-뛰노는-모습을-보고-싶다 [<한겨레21> 신 백두대간 기행 블로그]
금강산 못지 않은 수려한 암봉과 아름다운 폭포, 그리고 하늘빛을 담아내던 담과 소들도 더이상 전설을 말하지 않는다. 무너미고개가 깔딱고개로 이름이 바뀌고 산장의 밤을 밝히던 무용담이 소음이 돼버린 지금, 용의 이빨을 닮았다는 용아장성의 용들은 죽었고, 천화대의 돌꽃들은 다만 정복의 대상일 뿐이다.
20세기의 마지막 해를 보내는 설악산은 “너무나 아름다운 슬픈 산”이라는 박그림(52·설악녹색연합 대표)씨의 표현이 차라리 어울려 보인다. ‘설악산 털보’라는 별호로 더 알려진 유창서(62·권금성산장 관리인)씨는 “낭만을 잊은 탓”이라고 말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신흥사안내인협회 회장 이대성 노인을 그리는 이병태(57·이병태치과 원장)씨는 배웠다는 사람들의 오만 탓으로 돌린다. “61년 설악산을 처음 찾은 나도 그랬지만 초창기에 설악산을 찾았던 학자니 문인이니 산악인치고 이 노인 신세를 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안내 없이는 산을 오르지 못할 정도였지요. 하지만 어디 보세요. 설악산에 관련된 수많은 책 가운데 이대성이라는 이름 석자 기록해놓은 것이 있나.”
그랬다. 설악산을 몸과 마음을 닦는 수도의 도량으로 여겼던 옛 사람들의 지혜만 잊지 않았어도 설악산은 옛 모습을 잃어가지 않을 것이다. 해마다 설악산을 찾아드는 300여만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신흥사 길목 나무다리에 적힌 ‘세심교’라는 세글자를 읽으며 대자연에 들기 위해 마음을 닦는 이들이 몇이나 될까? 유교를 받들던 조선조에도 하찮은 돌과 흙뿐인 대청봉을 왜 ‘청정등신 비로자나불’이라 했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권금성 가는 길목 작은 암자인 안락암 대웅전 안내판에는 새소리와 아침 계곡에서 피워올리는 물안개조차도 비로자나불을 향한 공양이라 적어놓고 있다. 나뭇가지 하나 작은 돌 하나도 귀하게 여기라는 뜻일 게다.
금강산의 그늘에 가리고 험악한 지형으로 발길을 막아내던 설악산에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기 시작한 것은 50년대 후반부터. 그로부터 40여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 곰들이 꿀을 찾고 산양이 뛰놀던 설악산은 ‘죽은 산’이 돼버렸다. “지난 95년 정부는 설악산을 세계자연유산에 등록하려고 신청을 했죠. 지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되면 개발할 수가 없다며 연일 반대시위를 하고…. 결국 없던 일이 됐죠. 96년 조사관이 설악산을 돌아보고는 ‘동물이 없는 설악산은 죽은 산’이라고 말했죠. 결국 세계자연유산 등록이 거부당하면 다시 신청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정부가 등록 신청을 철회해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나버렸는데, 아직도 정부는 제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박그림씨는 당시 조사관이 관리체계가 비효율적이고 장기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는 것 등을 지적했는데도 정부의 자세는 변한 것 같지 않다는 질타를 빼놓지 않는다.
국립공원 설악산관리사무소는 구조조정의 칼날에 잔뜩 주눅 들어 있다. 최고 83명이었던 정규 직원수는 51명으로 줄었다. 그나마 올 봄 또 한번 구조조정 바람이 몰아 닥치면 몇 명이 남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개발예산보다 복구예산이 더 커진 게 96년. 쓰레기 줍기에 그치던 환경보호 업무도 한단계 더 진전돼 생태계 복구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졌지만 4개 분소와 11개 매표소를 관리하는 데만도 힘이 부쳐 보였다. “산이 좋아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직장으로 택했는데 담당 구역을 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하는 일이 매일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손익을 따지는 경영 개념이 앞서는 국립공원 정책에 대한 불만들도 작은 소리로 새어 나온다. “경영만 따진다면 더 많은 편의시설을 갖추고 더 많은 입장객들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는 곧 더 많은 훼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립공원 정책은 다음 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30여년간 설악산을 사진에 담아온 성동규(52)씨는 최근 들어 잦아진 가뭄을 사람들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사람들이 오염을 시킨 탓이에요. 벌써 큰 눈을 보기 힘들게 된 것이 10년은 넘어요. 여름에도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렇지 않고.” 도감에도 나오지 않는 풀을 찾아내 여기저기 관련 기관에 알리지만 좀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도 성씨의 큰 불만 가운데 하나다. “설악산에는 아직 보고 되지 않은 미기록종들이 많아요. 설악산이 더 나빠지기 전에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설악산은 해마다 건조기인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는 문을 닫아건다. 산불이 두렵기 때문이다. 유난히 가문 올 겨울, 설악산은 그 기간을 보름이나 앞당겼다. 아직도 설악산에 기다리던 눈이 왔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성씨의 말대로 그것은 자연을 경외할 줄 모르는 인간에 대한 하늘의 경고일지 모른다.
* 설악가는 치과의사 이정훈씨가 1969년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출처: http://100mt.tistory.com/entry/백두대간-사람들-8-설악산-산양이-뛰노는-모습을-보고-싶다 [<한겨레21> 신 백두대간 기행 블로그]
- 이전글백두대간사람들7 설악산 길골- 21세기가 두려운 전나무 천국 18.08.28
- 다음글백두대간 사람들 9 설악산 장수대- 키 큰 소나무 그늘에 묻힌 산골 재롱밭 18.08.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